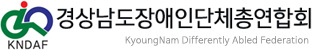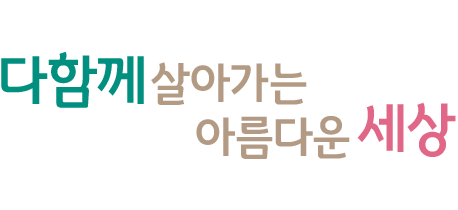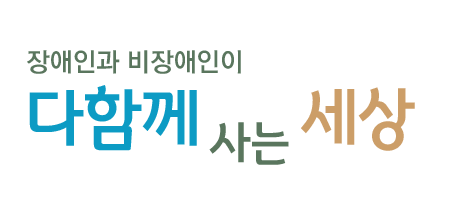#사례 1 = ㄱ(46·정신장애 3급) 씨는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20대 비장애인 남성 2명에게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 사본 등을 가져오면, 현금을 받게 해준다는 얘기였다.
이들 2명은 지난 11일과 13일 잇달아 각각 마산과 창원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ㄱ 씨 명의로 스마트폰 2대씩을 개통했고, 은행에서 ㄱ씨 명의로 된 통장도 만들었다. ㄱ 씨 측근은 "이들이 휴대전화 개통과 통장 개설로 ㄱ씨 이름으로 대출금을 받아내려고 했지만 ㄱ 씨가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대출을 받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4대 가운데 2대 는 행방을 알 수 없고 계약 해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스마트폰 이용 요금도 ㄱ씨가 내야 할 형편이다. ㄱ 씨는 "돈이 들어온다는 줄 알고 시키는 대로 했다. 한 달 생활비가 30여만 원인데, 속상하다"고 말했다.
#사례 2 = ㄴ(33·정신장애 3급) 씨는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한 대출업체에 상담을 받았다. ㄴ 씨는 "재산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밝혔지만, 업체는 서명만 몇 번 하면 된다며 이른바 '휴대폰 대출'을 권했다고 한다. 업체 쪽은 역시 인감증명서 등을 챙겨 오라 했고, 업체 사무실에서 ㄴ 씨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ㄴ 씨는 업체로부터 7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돈을 되갚지 않아도 괜찮고 휴대전화 사용 요금은 그냥 놔두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런데 매달 요금과 단말기 값이 ㄴ 씨한테 나왔고, 통신사와 채권추심 업체로부터 100여만 원을 내라는 독촉을 수차례 받아야 했다. 하지만, 대출업체는 행적을 감췄고, 'ㄷ 실장'이라는 것만 파악된 채 업자 신원도 알 수 없는 상태다. ㄴ 씨는 자신이 쓰지도 않은 요금을 갚고 있다.
이처럼 지적·정신장애인을 노리는 사기 사건이 늘고 있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30세 지적장애인을 폭행·협박해 대출금 300만 원을 받아내며, 휴대전화를 개설해 100만 원의 요금을 내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이어 서울에서도 30대 여성 지적장애인 명의로 현금 300만 원을 빌려 가로채고 40여 일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30대·5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이들 역시 장애인을 꾀어 인감증명서 등을 만들어 현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현녀 (사)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19일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장애인에게 환심을 사는 행동 뒤에 따르는 일"이라며 "대출이나 휴대전화 개통이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배려 없이 너무 쉽게 이뤄지고 있다. 지적·정신장애인은 늘 범죄에 노출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무분별하게 느는 대출업체와 휴대전화 대리점에 대한 규제와 개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황 국장은 "위임장 작성과 서명 등의 과정에서 장애인이 계약서 등에 있는 문구를 정확히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대출·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보는 이들도 장애인인 걸 빨리 인식하고 당사자에게 모든 내용을 인지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통계로 지난해까지 사기 사건과 관련한 신고가 한 해 평균 20건에 그치던 것이 올해 들어 보름 동안 4~5건이 들어왔다. 장애인 처지에서는 장애인 단체 말고는 신고할 데도 마땅치 않다. 억울하지만, 장애인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거나 하소연을 들어주는 곳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지적·정신장애인의 입장에서 피해를 확인하는 절차와 사후 처리까지 맡아야 하는데, 여기에 관한 전문 상담·복지 인력이나 홍보는 턱없이 부족하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신고도 못 하고 자신이 신용불량자인 줄도 모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