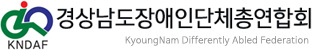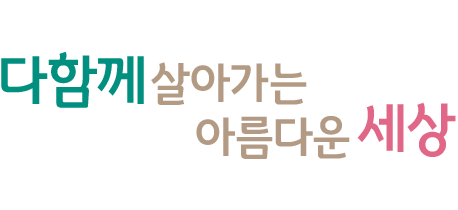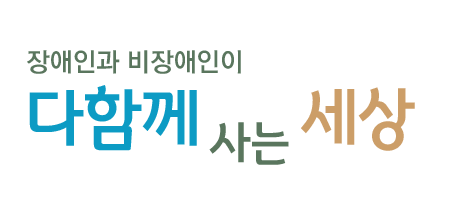기초지자체 100곳 저상버스 단 한대도 없어" (비마이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12-03 16:32 조회10,11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보급률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200명당 1대로 정한 특별교통수단 법정 의무 대수 산정의 근거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동편의정책 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토론회'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아래 모니터링센터) 28일 이른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동편의정책 모니터링 결과보고'를 맡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모니터링센터 이병원 연구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저상버스는 3,828대이며, 이중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저상버스는 2,514대로 전국 저상버스의 65.6%를 차지해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서울, 경남, 강원, 충북, 대전을 제외한 11개 시·도는 저상버스 도입률이 10% 미만"이라면서 "특히 경상북도는 24대로 2%, 전라북도는 27대로 3%를 기록하며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라고 설명했다.
도·농간 저상버스 도입 대수와 도입률의 차이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광역시 전체 시내버스 총 1만 6,580대 가운데 저상버스는 2,486대로 15%의 도입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도지역 전체시내버스 1만 5,972대 중에서 저상버스는 1,342대로 8.4%에 불과하다.
저상버스 도입책임이 있는 기초지자체 154곳 중 100곳에는 저상버스가 단 한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북도는 23곳 지자체 중 18곳에서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았고, 수도권인 경기도에서도 31곳 지자체 중 10곳에서 한 대도 없었다.
특별교통수단 역시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특별교통수단은 1,271대로 도입률은 법정도입 대수 대비 45.6%에 그쳤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의무가 있는 162개 지자체 중 69개 지자체만이 특별교통수단을 1대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모니터링 결과도 발표됐다. 모니터링센터에서는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지역 저상버스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 연구원은 "모니터 단원들이 서울지역 저상버스를 직접 탑승조사 한 결과 대기시간은 평균 18.2분으로 조사됐으며, 143회 탑승조사 중 24회는 대기시간이 30분 이상으로 조사됐다"라면서 "가장 오랜 대기시간은 2시간 32분으로 조사됐으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그냥 지나친 저상버스도 총 29대로 조사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저상버스는 버스기사가 장애인들에게 목적지를 확인해야 원활한 하차가 이루어짐에도 목적지를 확인한 경우는 83회, 미확인은 63회로 나타나 약 44%가 목적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콜택시의 대기시간은 저상버스보다 더욱 길었다. 9개 지역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을 조사한 결과 즉시콜의 경우 평균 50분 이상 대기한 지역이 3곳, 30분 이하의 대기시간을 기록한 지역은 2곳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즉시콜의 평균 대기시간은 1시간 30여 분(94.78분)으로 조사됐다. 시간대별로는 08~09시에 156분을 기록했다. 예약콜의 경우는 평균 대기시간이 46.75분으로 즉시콜에 비해 절반 정도였으나 17~21시 사이에는 예약하더라도 평균 81분이 소요됐다.
이 연구원은 "교통약자법에 의해 세워진 1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은 사실상 실패로 마무리됐으며, 각 지자체에서 교통약자법에 규정한 저상버스나 특별교통수단을 제대로 도입하는 곳이 매우 드물다"라면서 "국토해양부는 저상버스 도입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가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현재 경상남도에서 비교적 장애인 이동정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은 경상남도청의 주도하에 예산지원 및 정책결정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면서 "기초지자체는 한정된 예산으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는데 적잖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정책에서는 기초지자체보다 비교적 대규모 예산편성이 가능한 도청이 정책의 주도권을 확보해야만 각 시·군별 이동편의 정책의 편차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은 "저상버스 도입을 가로막는 요인에는 저상버스의 가격, 운영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법률에 저상버스 도입 연한이 명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서 저상버스 도입 연한을 정해두고 그 도입 연한까지 100% 도입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수립의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 사무총장은 특별교통수단 법정 의무 대수 산정의 근거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 사무총장은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면 특별교통수단이 충분한가는 접어두더라도 택시의 도입 대수 산정기준이 시민 200명당 1대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면 그것은 틀린 산정 기준"이라면서 "1, 2급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적기 때문에 비장애인이 택시에 의존하는 의존도보다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통약자이동권연대 김진규 집행위원장은 "지난 6월 일부 법 개정을 통해 도지사의 계획 수립 의무와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만들었지만,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 의무와 권한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다"라면서 "현행법 16조 3항의 도지사의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임의 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전국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조사결과 보고 및 이동편의정책 대안 제시하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대한 의견수렴 및 개정방향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